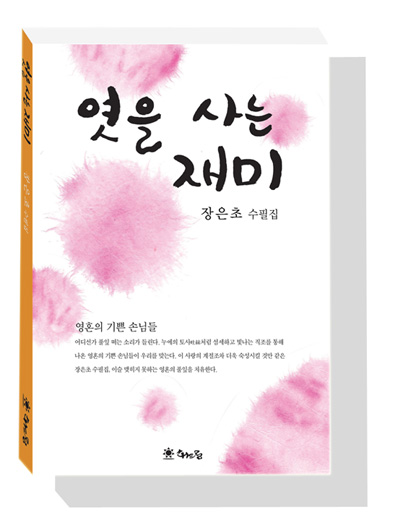엿을 사는 재미/장은초
페이지 정보
작성자본문
엿을 사는 재미
장은초
모처럼 재래시장에 들렀더니 엿이 잔뜩 쟁여있는 리어카가 제일 먼저 눈에 띄었다. 그러고 보니 수능시험이 바투 닥쳤나보다. 쌀쌀한 날씨 때문이었을까, 리어카 한쪽에 쭈그리고 앉아 늦은 점심을 먹는 늙수그레한 엿장수가 안쓰러워 보였다.
‘엿장수가 안쓰럽다고?’ 혼자 중얼거리다가, 그 옛날 엿장수가 우리들에게 어떤 존재였던가를 떠올려보니 슬며시 웃음이 나왔다. 엿장수는 결코 안쓰러울 수도 없고 초라할 수도 없는 우리들의 슈퍼스타였던 시절이 있었다.
콩엿, 깨엿, 호박엿, 생엿 등 입맛대로 갖추갖추 쌓인 엿 중에서 나는 콩엿을 2천원어치 샀다. 딱히 엿이 먹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냥 엿이 사고 싶어서였다.
“엄마가 어렸을 땐 산에 쇠를 주우러 다녔단다.” 내 말이 생뚱맞게 들리는지 아들 녀석들은 한번 피식 웃고 말았다. 마치 나무 위에 올라가서 물고기를 구한다는 ‘연목구어(緣木求魚)’처럼 황당무계한가보다. 하지만 내가 산에 쇠를 주우러 다녔던 건, 빈말이 아닌 사실이다.
초등학교 다니던 시절, 반공일(半空日)인 토요일 오후면 옆집 경숙언니랑 쇠를 찾아 온 산을 헤매고 다녔다.
장마다 꼴뚜기 나는 건 아닐 테고, 타자가 방망이 휘두를 때마다 다 홈런치는 건 아니듯이 온 산을 헤매고도 빈손 일 때가 더 많았다. 어쩌다 운 좋은 날엔 어른 손바닥만 한 쇠를 줍기도 하는데 그런 날은 심마니가 산삼 본 횡재에 버금가는 날이었지 싶다.
경숙언니는 나보다 눈이 훨씬 작으면서도 큼직한 쇠붙이를 잘도 주웠지만 나는 고작 아기 손가락만 한 쇳조각이나 탄피 몇 개 줍는데 그쳤다.
요즘 아이들 시각으로 보자면 대체 무엇 때문에 산으로 쇠를 주우러 다녔으며, 산에 왜 쇠가 널려 있었던 걸까. 궁금하지 않다면 그게 되레 이상할 터이다. 산천에 산산이 흩어진 그 쇳조각이 6.25전쟁 당시, 꽃다운 영령들이 포탄의 불바다에서 산화(散華)해 간 슬픈 흔적이라는 것을 전후세대 조무래기들은 까맣게 몰랐었다. 우리에겐 그저 달콤한 호박엿을 바꾸기 위한 대체화폐에 지나지 않았다.
긴긴 여름날 오후, 쩔꺼덕 쩔꺼덕 엿장수의 가위소리가 들려오면 아이들은 저마다 불을 쫓는 불나방처럼 몰려나왔다. 일주일에 한 번씩 시골마을로 리어카를 끌고 찾아오는 엿장수가 왜 그리도 반갑던지, 산에서 주워다 귀히 모셔둔(?) 쇠붙이를 들고 엿을 사러 가던 발걸음은 왜 그리도 설레던지….
엿판에 색색으로 뿌려진 사탕가루는 보기만 해도 저절로 도리깨침이 고였다. 아무리 엿판을 남상대도 그냥 줄 리는 만무할 터, 엿을 먹으려면 돈을 가져오든 고물을 가져오든 둘 중 하나는 있어야 했다. 돈도 귀했지만 고물도 귀하기는 마찬가지였으니 조무래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너나없이 껄떡이가 되어 엿장수 뒤를 졸졸 따라다니는 것 밖에 도리가 없었다.
어린 시절, 나는 어머니가 휘두르는 부지깽이를 피하느라 집에서 두 번 쫓겨난 적이 있었다. 한번은 소나기 오는 날 장독뚜껑을 덮지 않아 장을 몽땅 망쳐놔서이고 또 한번은 엿장수 때문이었다.
까만 눈을 반짝거리며 유난히 껄떡대는 나에게, 집에 가서 고물을 찾아오라고 엿장수가 살살 꾀었다. 엿장수가 사라져 버릴까봐 조바심을 내다가 마루 밑에 아버지 어머니 흰 고무신이 생각났다. 부모님에게 흰 고무신이란, 갈음옷을 입고 맑은 장소에 갈 때나 신는 특별한 신이었다. 구렁이 아래턱 여기듯 하는 신발을, 나는 각각 한 짝씩 들고 나왔다. 새 신이나 다름없는 신발값을 후하게 쳤는지 혼자서 한번은 퇴내게 먹을 만한 양의 엿을 끊어주었다.
저녁 무렵, 신발이 없어진 걸 아신 어머니는 단번에 내 소행으로 단정 짓고 부지깽이를 들고 나오셨다. 차라리 아버지 신이든 어머니 신이든 한 켤레로만 엿을 사 먹었더라면 어머니께 야단을 덜 맞았을 텐데, 나는 왜 그리도 아둔했을까.
지역축제가 열리는 풍물시장에 가보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건 엿장수이다. 경쾌한 음악에 맞춰, 아이돌 가수 못지않은 현란한 몸동작으로 사람들의 눈길과 발길을 붙드는 데는 엿장수가 단연 발군이다. 온갖 먹을거리가 풍성해, 뭘 먹을지 골라먹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나는 언제 어디서든 엿장수의 가위 소리만 들으면 시공을 초월해 예닐곱 살 계집아이처럼 주전부리에 안달한다. 아버지에게 엿을 사 달라고 무던히도 졸라대던 꼬맹이가 이젠 남편에게 엿을 사 달라고 조른다. 물론 입맛이 당겨서라기보다 엿을 사면 추억이 덤으로 딸려오는 재미 때문이다.
이 강산에 6.25전쟁이 끝난 지도 반세기가 훌쩍 넘었다.
고향 산비알에는 미처 다 찾아내지 못한 쇠가 아직도 남아 있을까. 시골마을 늘솔길로 쩔꺽쩔꺽 가위소리를 내며 엿장수가 찾아드는 낭만이 아직 존재할까. 엿을 껄떡대다 못해 아버지 어머니 고무신을 팔아먹는 잔망스런 계집아이가 아직도 그곳에 있을까.
‘쇠는 벌겋게 녹슬어 산화(酸化)된 지 오래고 , 엿장수는 돈벌이가 되는 팔도 풍물시장으로만 다니고, 엿을 좋아하던 꼬맹이 계집아이는 너무 커 버려서 더 이상 엿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번번이 대답 없는 물음이 안쓰러웠는지 오늘은 바람이 넌지시 알려주고 총총히 달아났다.
해드림 이승훈 출판과 문학 발행인 해드림출판사 대표 수필집[가족별곡](2012) [외삼촌의 편지] [국어사전에 있는 예쁜 낱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